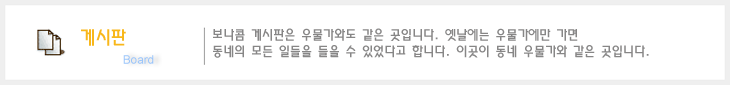
BSL - Bonacenter for Sustainable Life
모두가 숨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겨울 동안 생명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다. 혹자는 쉼 없이 달려온 한해를 정리하고 안식하는 시간이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도 한다. 어째든 겨울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봄의 기운이 솟기 시작하면 대지는 마치 100m 출발선에 선 선수들처럼 땅을 박차고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작은 생명들이 드디어 봄의 향연으로 초대되는 것이다. 새싹이 돋고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며 물가에는 짝을 찾는 개구리들의 합창이 그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우렁차다. 들을 수 없던 박새의 청아한 노래도 들려오고 늘 듣던 까치의 울음도 춘풍에 묻어 생명의 찬가로 들려온다. 봄은 진정한 다양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저마다의 생명으로 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그 작은 역사들의 현장이 바로 지금의 시간들이 아닐까 한다.
내가 사는 곳은 해발 350m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늦게 봄이 온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은 그나마 짧은 봄의 향연을 바로 여름으로 내달리게 한다. 그래도 다양한 생명은 자기들 본연의 임무가 있기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려한다. 사실 인간은 너무 오만하다. 돌 틈에 피어난 풀 한포기도 분명 창조주가 맡긴 역할이 있을 텐데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시하고 없애려 한다. 나 역시 농사를 짓기에 작은 풀들, 흔히 잡초라는 것들과 작은 벌레들, 또는 병해충들이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 이들이 괴롭힐 때면 그들과 전쟁을 치루느냐고 너무도 힘이 든다. 그렇다고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화학약품을 쓰면 나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된다. 왜냐하면 내가 경작하는 논과 밭에는 나만이 살아가기 위한 땅이 아니기에 그렇다. 그곳에는 소위 잡초들도 무수하지만 작은 곤충들도 어마어마하고 더욱이 땅속의 미생물들은 그 수조차 헤아리기 어렵다. 보통 엄지와 검지로 흙을 집어 올리면 그것을 흙 한 자밤이라 하는데 이 적은 양의 흙속에 무려 10억 개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고 한다. 나 한번 편하고자 한 번에 그 많은 생명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하다. 요즘 논밭에 나가면 뚜렷이 구별되는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산과 들은 마냥 푸르러 가는데 논밭들의 경계를 표시한 것인지 각각이 또렷이도 노랗게 나누어져 있다. 우리에 어르신들이 힘에 겨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처방을 하신 것이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다. 근면한 농부에게 있어서 논밭에 풀이 난다는 것은 게으름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그 땅에 있는 생명만을 죽이겠는가? 그 약을 먹은 벼는 우리에게 농축된 쌀로 돌려주는 것이요, 흘러들어간 하천은 우리의 마실 물로 돌아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그 많은 병들은 무엇 때문이며 더욱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희귀병과 암들은 자연발생하는 것일까?
처음에 귀농하여 일머리도 모르면서 더욱이 친환경농업을 한다면서 풀반 벼반으로 농사를 짓자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세월이 흘러 여러 자재의 발전과 도움으로 화학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많이 쉬워졌다. 조금의 연구와 노력이면 가능하다. 오늘 하루에도 100종의 생물이 멸종되어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간다고 한다. 그들이 지구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이기적 이익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야 말 것이다. 자연은 자연다워야 한다. 전국토를 쪼개고 쪼개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 건설이 도로공사가 있는 이유이다. 이제는 물길로도 이 작은 한반도를 나누고 나누려 하니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그래서 한반도운하건설에 반대한다. 더 잘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풍요로운 것이며 행복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