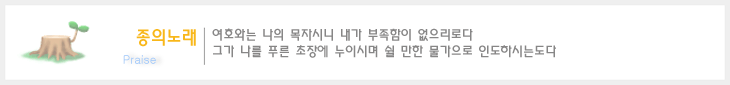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가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고독한 눈빛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무심코 요한 복음 6장을 읽다가
짙은 눈썹 아래로 눈물을 머금었을 것만 같은
그 눈빛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
결코 쉽게 끄집어내기 어려우셨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셨건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하나 없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며 말입니다.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주님은 천천히 돌아서시며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난처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떠나간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심장이 멈추는 듯한 가슴의 심한 통증과 함께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도
떠나 보내는 아픔을 아시는구나.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슴 저미는
고독이 예수님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이제 겨우 세 번째 겨울을 이곳에서 만나는 동안
공동체로 살며 느끼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떠나보내는 아픔은 지금처럼 동일한 고통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다가
어느 날 제 불찰로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미묘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들의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는 제 눈가에는 늘
눈물이 고이곤 했었는데...
내 주님도 그렇게 울고 계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