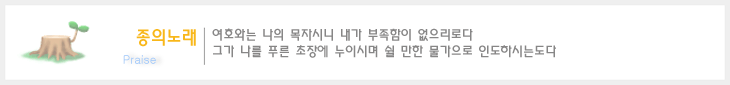멀리 인도를 다녀온 후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일단 시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밤에 잘려고 눈을 감으면
내가 보았던 사람들, 수건을 두른 아낙네들, 까만 피부에 예쁜 눈을 가진
그러나 그 눈에 슬픔으로 가득하던 그곳의 아이들
깡마른 남정네들의 후적거리며 걷던 모습들까지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품고 먹이고 살리다 지칠대로 지쳐버린 그곳의 대지의 신음소리,
내가 만져보았던 흙들, 늙은 어미의 마른 젖가슴처럼 말라비틀어져
자신을 추스릴 힘 하나 없어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흙먼지로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아니 깡마른 흙들이 토해내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까지
내 귓전을 울리고 내 눈가에 어른거려
나는 먹을수도 마실수도 그리고 숨을 쉬는 일마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지내는 동안
멀리 이리안자야에서 오신 원주민들과 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에서 오신 현지인과 사역자들을 만나 몸을 일으켜
다시 농업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영혼들
지친 대지를 바라보고 만나면서 내 마음이 이리도 힘들거늘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더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이리안자야, 그 멀고 낯선 곳에서는 아직도 수렵과 채취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구할 것이 없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먹을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르지 않으셨지만 내가 먼저 꼭 한번 가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오시기를 기다리겠노라고 와서 도와달라는
현지인 목사님의 거친 손을 저도 꼭 잡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