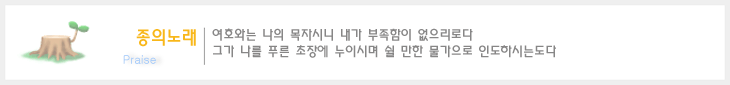몇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거름더미를 호미랑 빈 통을 하나 들고 찾아갔습니다.
덮어둔 비닐을 들쳐 올리자 아니나 다를까
크기도 다양한 지렁이들이 엄청납니다.
호미로 거름을 파해치며
장갑을 낀 손으로 굵은 것들만 골라서 담으며
한시간 가량 시간이 흐르자 제법 많은 지렁이를 잡았습니다.
지난 봄에는 냇가에서 올챙이들을 사흘에 한번씩 잡아다
병아리들을 먹였는데 여름이는 이렇게 지렁이를 잡아 먹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앉았다 일어서니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고 온 몸은 땀에 흠뻑 젓었습니다.
양계장까지 내려오는 길은 내리막길이라
자전거를 타고 밀려오는 맞바람을 맞으며 눈을 지그시 감으니
온통 지렁이만 눈 앞에서 아른 거립니다.
양계장에 도착하니 이제는 내 걸음소리만 들어도 아는지
다들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웅큼씩 군데군데 놓아주어 먹게 하니
게눈감추듯 맛나게 먹어치우고 더 먹으려 사방을 두리번 거립니다.
뭘 좀 먹었습니까? 라시던 동막골의 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뭘 좀 먹이는 것인게죠.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오셔서 값없이 돈없이 와서 먹으라시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떡과 함께 복음을 이라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지요.